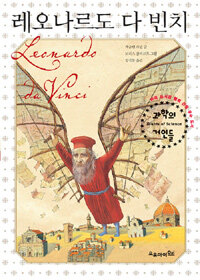#1.
고냥이님의 블로그에서 "
당신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을 접했다. 그러게, 요새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 상대로부터 지켜질 때 심리적인 안정을 느낀다는 최소한의 거리, 사회적 거리라던가,
그 거리를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다들 너무나도 예의가 발라서인지, 아님 알게 모르게 내가 극상의 반탄강기
기술을 시전하고 있던지 간에, 표면만 살짝살짝 건드려보거나 톡톡 두들겨보는, 그 짧고 얕은 진동으로 상대의 안부를
묻는 그런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뚜, 뚜우, 뚜우, 뚜, 잘 살고 있습니까. 뚜뚜, 뚜우, 뚜뚜뚜, 예(방긋). 요딴거.
내일 알제리로 출장을 떠나, 금요일에나 돌아올 예정이다. 알제리가 어디 붙어있냐 하면, 북아프리카, 프랑스의 아랫쪽,
지중해와 접한 아프리카국가. 왼쪽엔 모로코, 오른쪽엔 리비아, 리비아 오른쪽엔 이집트...
내가 알제리에 있건, 한국에 있건, 한밤중 이렇게 인터넷을 부유하건, 그 거리는 중요치 않다. 마치 '상실의 시대'에서
와타나베가 스스로 걸었던 걸음을 세거나 계단수를 세거나 하는 것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듯, 문제는 거리 자체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거리에 관심이 없다는 그 사실이다. 내가 어디 붙어있냐 하면, 서울 역삼동 우리집 책상앞
의자 위, 모니터 위 점멸하는 커서 상단 주먹하나 위쯤, 알제리로 향한 비행기가 마침 뉴칼레도니아 상공을 지나..
뭐 그런 거, 질문하지 않는데 굳이 답할 수 없는 거다. 관심없다는데 말할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알제리던 어디던, 내가 사람들과 느끼는 거리감이란 항상 그만큼. 어쩌면 일종의 초기값. 디폴트값.
알제리와 한국. 출장도 가기 전인데, 오늘하루 벌써 열두번쯤은 그 디폴트 거리값을 느끼고 말았다.
#2.
내일부터 알제리에 출장, 4박5일..이라지만 좁디좁은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관짝체험하는 시간을 제하면 고작 2박 3일
체류 예정이다. 노무현이 뿌려놓은 한국-알제리 경제협력 태스크 포스 합동회의. 아마 꼼짝없이 호텔 안에만 잡혀서
지낼 거 같지만, 그래도 뭔가 또 바득바득 사진도 찍고 감상도 불러일으켜볼 생각이다.
가기 전에 이집트 여행기를 완료하고 싶었고, 책 나눔도 한번 더 하고 싶었는데 막판까지 너무 정신없이 굴러갔다.
DHL로 미리 부쳤던 두 박스 중 하나가 중간에 실종되는가 하면, 인원 확정이 막판까지 되지 않아 숙소와 차량 문제가
엉망이었고-여전히 엉망이고-,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관료들의 일처리까지. 쉐라톤 알제 호텔의 수영장이 멋지다길래
혹시 몰라 수영복은 챙겨가는데, 역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3.
문제를 못 풀겠으면 잔뜩 다시 헝클어버리고 시작한다. 변수를 추가하고, 상황을 마음가는대로 꼬아버리고. (종종
그런 거친 소울이 발현되는 방식은 지극히 자기파괴적이고 시니컬하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점점 산으로.
시간 제약은 있고, 문제는 난해하고, 차라리 '친구야 미안해'라고 쓴 보드를 머리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게 깔끔한 걸까.
아니면 화이트보드를 물고 차고 던지면서 스튜디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강짜를 부려야 할까.
어디 한번 어디까지 치닫나,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자는 심보는, 묘한 쾌감과 중독적인 마력을 동반한다.
차라리 출장을 떠나서 다행이다. 요새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폐족'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는 모양이더만, 지금 내겐
스스로를 '폐(閉)'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잠시 문제를 잊고 머리를 식혀야 한다니, 강제적인 쿨링시스템의
가동이랄 만한 출장이 내일이다. 내일 아침 9시비행기. 밤새 부유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