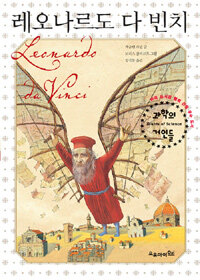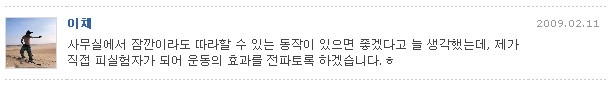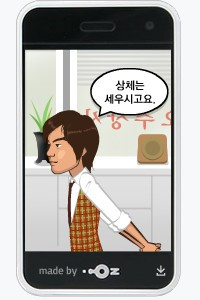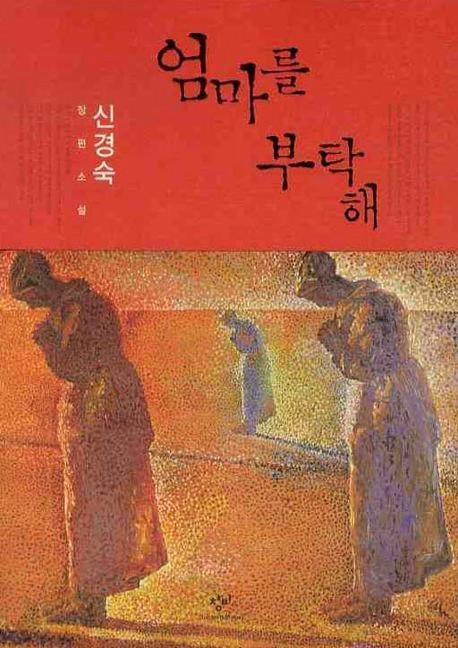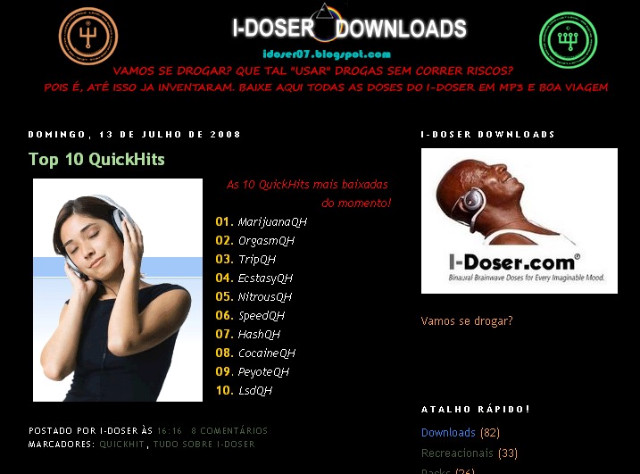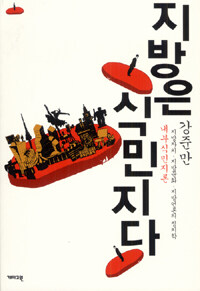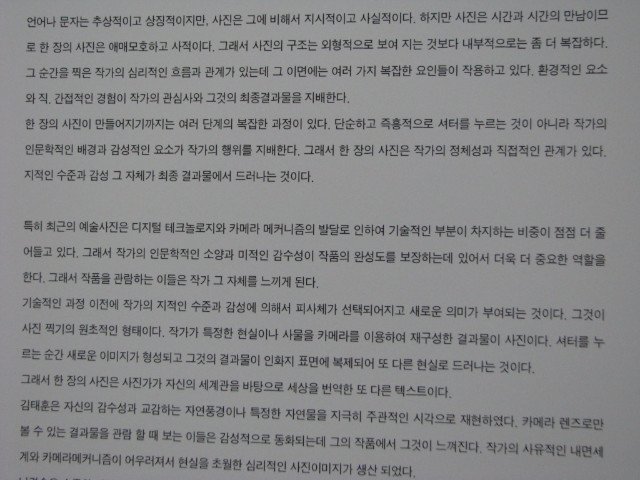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or Immediate Release March 10, 2009
Remarks of President Barack Obama
A Complete and Competitive American Education
US Hispanic Chamber of Commerce
March 10, 2009
Washington, DC
Every so often, throughout our history, a generation of Americans bears the responsibility of seeing this country through difficult times and protecting the dream of its founding for posterity. This is a responsibility that has fallen to our generation. Meeting it will require steering our nation’s economy through a crisis unlike any we have seen in our time. In the short-term, that means jumpstarting job creation, re-starting lending, and restoring confidence in our markets and our financial system. But it also means taking steps that not only advance our recovery, but lay the foundation for lasting, shared prosperity.
I know there are some who believe we can only handle one challenge at a time. They forget that Lincoln helped lay down the transcontinental railroad, passed the Homestead Act, and created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 the midst of Civil War. Likewise, President Roosevelt didn’t have the luxury of choosing between ending a depression and fighting a war. President Kennedy didn’t have the luxury of choosing between civil rights and sending us to the moon. And we don’t have the luxury of choosing between getting our economy moving now and rebuilding it over the long term.
America will not remain true to its highest ideals -and America’s place as a global economic leader will be put at risk- unless we not only bring down the crushing cost of health care and transform the way we use energy, but also do a far better job than we have been doing of educating our sons and daughters; unless we give them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need in this new and changing world.
For we know that economic progress and educational achievement have always gone hand in hand in America. Land-grant colleges and public high schools transformed the economy of an industrializing nation. The GI Bill generated a middle class that made America’s economy unrivaled in the 20th century. And investments in math and science under President Eisenhower made it possible for Sergei Brin to attend graduate school and found an upstart company called Google that would forever change our world.
The source of America’s prosperity, then, has never been merely how ably we accumulate wealth, but how well we educate our people. This has never been more true than it is today. In a 21st century world where jobs can be shipped wherever there’s an internet connection; where a child born in Dallas is competing with children in Delhi; where your best job qualification is not what you do, but what you know - education is no longer just a pathway to opportunity and success, it is a prerequisite.
That is why workers without a four-year degree have borne the brunt of recent layoffs, Latinos most of all. And that is why, of the thirty fastest growing occupations in America, half require a Bachelor’s degree or more. By 2016, four out of every ten new jobs will require at least some advanced education or training.
So let there be no doubt: the future belongs to the nation that best educates its citizens - and my fellow Americans, we have everything we need to be that nation. We have the best universities and the most renowned scholars. We have innovative principals, passionate teachers, gifted students, and parents whose only priority is their child’s education. We have a legacy of excellence, and an unwavering belief that our children should climb higher than we did.
And yet, despite resources that are unmatched anywhere in the world, we have let our grades slip, our schools crumble, our teacher quality fall short, and other nations outpace us. In 8th grade math, we’ve fallen to 9th place. Singapore’s middle-schoolers outperform ours three to one. Just a third of our thirteen and fourteen-year olds can read as well as they should. And year after year, a stubborn gap persists between how well white students are doing compared to their African American and Latino classmates.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n education is untenable for our economy, unsustainable for our democracy, and unacceptable for our children - and we cannot afford to let it continue.
What is at stake is nothing less than the American dream. It is what drew my father and so many of your fathers and mothers to our shores in pursuit of an education. It’s what led Linda Brown and Gonzalo and Felicitas Mendez to bear the standard of all who were attending separate and unequal schools. It is what has led generations of Americans to take on that extra job, to sacrifice the small pleasures, to scrimp and save wherever they can, in the hopes of putting away enough, just enough, to give their child the education that they never had. It’s that most American of ideas, that with the right education, a child of any race, faith, or station, can overcome whatever barriers stand in their way and fulfill their God-given potential.
Of course, we have heard all this year after year after year - and far too little has changed. Not because we are lacking sound ideas or sensible plans - in pockets of excellence across this country, we are seeing what children from all walks of life can and will achieve when we do a good job of preparing them. Rather, it is because politics and ideology have too often trumped our progress.
For decades, Washington has been trapped in the same stale debates that have paralyzed progress and perpetuated our educational decline. Too many supporters of my party have resisted the idea of rewarding excellence in teaching with extra pay, even though we know it can make a difference in the classroom. Too many in the Republican Party have opposed new investments in early education, despite compelling evidence of its importance. It’s more money versus more reform, vouchers versus the status quo. There has been partisanship and petty bickering, but little recognition that we need to move beyond the worn fights of the 20th century if we are going to succeed in the 21st Century.
Well, the time for finger-pointing is over. The time for holding ourselves accountable is here. What’s required is not simply new investments, but new reforms. It is time to expect more from our students. It is time to start rewarding good teachers and stop making excuses for bad ones. It is time to demand results from government at every level. It is time to prepare every child, everywhere in America, to out-compete any worker, anywhere in the world. It is time to give all Americans a complete and competitive education from the cradle up through a career. We have accepted failure for too long. Enough. America’s entire education system must once more be the envy of the world.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budget I am submitting to Congress has begun to achieve. At a time when we’ve inherited a trillion-dollar deficit, we will start by doing a little housekeeping, going through our books, and cutting wasteful education programs. My outstanding Secretary of Education Arne Duncan will use only one test when deciding what ideas to support with your precious tax dollars. It’s not whether an idea is liberal or conservative, but whether it works. This will help free up resources for the first pillar in reforming our schools -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initiatives. This isn’t just about keeping an eye on our children, it’s about educating them. Studies show that children in these programs are more likely to score higher in reading and math, more likely to graduate from high school and attend college, more likely to hold a job, and more likely to earn more in that job. For every dollar we invest in these programs, we get nearly ten dollars back in reduced welfare rolls, fewer health costs, and less crime. That is why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I signed into law invests $5 billion in growing Early Head Start and Head Start, expanding access to quality child care for 150,000 more children from working families, and doing mo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it is why we are going to offer 55,000 first-time parents regular visits from trained nurses to help make sure their children are healthy and prepare them for school and life.
Even as we inves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let’s raise the bar for early learning programs that are falling short. Today, some children are enrolled in excellent programs. Some are enrolled in mediocre ones. And some are wasting away their most formative years. That includes the one fourth of all kindergartners who are Hispanic, and who will drive America’s workforce of tomorrow, but who are less likely to have been enrolled in early education programs than anyone else.
That is why I am issuing a challenge to our states. Develop a cutting-edge plan to raise the quality of your early learning programs. Show us how you’ll work to ensure that children are better prepared for success by the time they enter kindergarten. If you do, we will support you with an Early Learning Challenge Grant that I call on Congress to enact. That is how we will reward quality, incentivize excellence, and make a down payment on the success of the next generation.
Second, we will end what has become a race to the bottom in our schools and instead, spur a race to the top by encouraging better standards and assessments. This is an area where we are being outpaced by other nations. It’s not that their kids are any smarter than ours - it’s that they are being smarter about how to educate their kids. They are spending less time teaching things that don’t matter, and more time teaching things that do. They are preparing their students not only for high school or college, but for a career. We are not. Our curriculum for eighth graders is two full years behind top performing countries. That is a prescription for economic decline. I refuse to accept that America’s children cannot rise to this challenge. They can, they must, and they will meet higher standards in our time.
Let’s challenge our states to adopt world-class standards that will bring our curriculums into the 21st century. Today’s system of fifty different sets of benchmarks for academic success means 4th grade readers in Mississippi are scoring nearly 70 points lower than students in Wyoming - and getting the same grade. Eight of our states are setting their standards so low that their students may end up on par with roughly the bottom 40% of the world.
That is inexcusable, and that is why I am calling on states that are setting their standards far below where they ought to be to stop low-balling expectations for our kids. The solution to low test scores is not lower standards - it’s tougher, clearer standards. Standards like those in Massachusetts, where 8th graders are now tying for first - first - in the world in science. Other forward-thinking states are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by coming together as part of a consortium. More states need to do the same. And I am calling on our nation’s Governors and state education chiefs to develop standards and assessments that don’t simply measure whether students can fill in a bubble on a test, but whether they possess 21st century skills like problem-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entrepreneurship and creativity. That is what we will help them do later this year when we finally make No Child Left Behind live up to its name by ensuring not only that teachers and principals get the funding they need, but that the money is tied to results. And Secretary Duncan will also back up this commitment to higher standards with a fund to invest in innovation in our school districts.
Of course, raising standards alone will not make much of a difference unless we provide teachers and principals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make sure students are prepared to meet those standards. Far too few states have data systems like the one in Florida that keep track of a student’s education from childhood through college. And far too few districts are emulating the example of Houston and Long Beach, and using data to track how much progress a student is making and where that student is struggling - a resource that can help us improve student achievement, and tell us which students had which teachers so we can assess what’s working and what’s not. That is why we are making a major investment in this area that we will cultivate a new culture of accountability in America’s schools.
To complete our race to the top requires the third pillar of reform -- recruiting, preparing, and rewarding outstanding teachers. From the moment students enter a school,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ir success is not the color of their skin or the income of their parents, it’s the person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classroom. That is why our Recovery Act will ensure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teachers and school personnel are not laid off - because those Americans are not only doing jobs they cannot afford to lose they are rendering a service our nation cannot be denied.
America’s future depends on its teachers. And so today, I am calling on a new generation of Americans to step forward and serve our country in our classrooms. If you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life of our nation; if you want to make the most of your talents and dedication; if you want to make your mark with a legacy that will endure - join the teaching profession. America needs you. We need you in our suburbs. We need you in our small towns. We need you in our inner cities. We need you in classrooms all across our country.
And if you do your part, we’ll do ours. That is why we are taking steps to prepare teachers for their difficult responsibilities and encourage them to stay in the profession. That is why we are creating new pathways to teaching and new incentives to bring teachers to schools where they are needed most. It is why we support offering extra pay to Americans who teach math and science to end a teacher shortage in those subjects. And it is why we are building on the promising work being done in South Carolina’s Teacher Advancement Program, and making an unprecedented commitment to ensure that anyone entrusted with educating our children is doing the job as well as it can be done.
Here is what that commitment means: It means treating teachers like the professionals they are while also holding them more accountable - in up to 150 more school districts. New teachers will be mentored by experienced ones. Good teachers will be rewarded with more money for improved student achievement, and asked to accept more responsibilities for lifting up their schools. Teachers throughout a school will benefit from guidance and support to help them improve.
And just as we have to give our teachers all the support they need to be successful, we need to make sure our students have the teacher they need to be successful. That means states and school districts taking steps to move bad teachers out of the classroom. Let me be clear: if a teacher is given a chance but still does not improve, there is no excuse for that person to continue teaching. I reject a system that rewards failure and protects a person from its consequences. The stakes are too high. We can afford nothing but the best when it comes to our children’s teachers and to the schools where they teach.
That leads me to the fourth part of America’s education strategy - promoting innovation and excellence in America’s schools. One of the places where much of that innovation occurs is in our most effective charter schools. These are public schools founded by parents, teachers, and civic or community organizations with broad leeway to innovate - schools I supported as a state legislator and United States Senator.
Right now, there are caps on how many charter schools are allowed in some states, no matter how well they are preparing our students. That isn’t good for our children, our economy, or our country. Of course, any expansion of charter schools must not result in the spread of mediocrity, but in the advancement of excellence. That will require states adopting both a rigorous selection and review process to ensure that a charter school’s autonomy is coupled with greater accountability - as well as a strategy, like the one in Chicago, to close charter schools that are not working. Provided this greater accountability, I call on states to reform their charter rules, and lift caps on the number of allowable charter schools, wherever such caps are in place.
Even as we foster innovation in where our children are learning, let’s also foster innovation in when our children are learning. We can no longer afford an academic calendar designed when America was a nation of farmers who needed their children at home plowing the land at the end of each day. That calendar may have once made sense, but today, it puts u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Our children spend over a month less in school than children in South Korea. That is no way to prepare them for a 21st century economy. That is why I’m calling for us not only to expand effective after-school programs, but to rethink the school day to incorporate more time - whether during the summer or through expanded-day programs for children who need it. I know longer school days and school years are not wildly popular ideas. Not in my family, and probably not in yours. But the challenges of a new century demand more time in the classroom. If they can do that in South Korea, we can do i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course, no matter how innovative our schools or how effective our teachers, America cannot succeed unless our students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education. That means showing up for school on time, paying attention in class, seeking out extra tutoring if it’s needed, and staying out of trouble. And to any student who’s watching, I say this: don’t even think about dropping out of school. As I said a couple of weeks ago, dropping out is quitting on yourself, it’s quitting on your country, and it is not an option - not anymore. Not when our high school dropout rate has tripled in the past thirty years. Not when high school dropouts earn about half as much as college graduates. And not when Latino students are dropping out faster than just about anyone else. It is time for all of us, no matter what our backgrounds, to come together and solve this epidemic.
Stemming the tide of dropouts will require turning around our low-performing schools. Just 2,000 high schools in cities like Detroit, Los Angeles, and Philadelphia produce over 50% of America’s dropouts. And yet, there are too few proven strategies to transform these schools. And there are too few partners to get the job done. So today, I am issuing a challenge to educators and lawmakers, parents and teachers alike - let us all make turning around our schools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 as Americans. That will require new investments in innovative ideas. That is why my budget invests in developing new strategies to make sure at-risk students don’t give up on their education; new efforts to give dropouts who want to return to school the help they need to graduate; and new ways to put those young men and women who have left school back on a pathway to graduation.
The fifth part of America’s education strategy is providing every American with a quality higher education - whether it’s college or technical training. Never has a college degree been more important. And never has it been more expensive. At a time when so many of our families are bearing enormous economic burdens, the rising cost of tuition threatens to shatter dreams. That is why will simplify federal college assistance forms so it doesn’t take a PhD to apply for financial aid. And that is why we are already taking steps to make college or technical training affordable.
For the first time ever, Pell Grants will not be subject to the politics of the moment or the whims of the market - they will be a commitment that Congress is required to uphold each and every year. Further, because rising costs mean Pell Grants cover less than half as much tuition as they did thirty years ago, we are raising the maximum Pell Grant to $5,550 a year and indexing it above inflation. We are also providing a $2,500 a year tuition tax credit for students from working families. And we are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Perkins Loan Program to make sure schools like UNLV don’t get a tenth as many Perkins Loans as schools like Harvard. To help pay for all of this, we are putting students ahead of lenders by eliminating wasteful student loan subsidies that cost taxpayers billions each year. All in all, we are making college affordable for seven million more students with a sweeping investment in our children’s futures and America’s success. And I call on Congress to join me - and the American people - by helping make these investments possible.
This is how we will help meet our responsibility as a nation to open the doors of college to every American. But it will also be the responsibilit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control spiraling costs.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our students to walk through those doors of opportunity. In just a single generation, America has fallen from second place to eleventh place in the portion of students completing college. That is unfortunate but it is by no means irreversible. With resolve and the right investments, we can retake the lead once more. That is why, in my address to the nation the other week, I called on Americans to commit to at least one year or more of higher education or career training, with the goal of having the highest proportion of college graduates in the world by the year 2020. To meet that goal, we are investing $2.5 billion to identify and support innovative initiatives across the country that achieve results in helping students persist and graduate.
And let’s not stop our education with college. Let’s recognize a 21st century reality: learning does not end in our early 20s. Adults of all ages need opportunities to earn new degrees and skills. That means working with all our universities and schools, including community colleges, a great and undervalued asset, to prepare workers for good jobs in high-growth industries; and to improve access to job training not only for young people who are just starting their careers, but for older workers who need new skills to change careers.
It is through initiatives like these that we will see more Americans earn a college degree, or receive advanced training, and pursue a successful career. That is why I am calling on Congress to work with me to enact these essential reforms, and to reauthorize the Workforce Investment Act. That is how we will round out a complete and competitiv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yes, we need more money. Yes, we need more reform. Yes, we need to hold ourselves more accountable for every dollar we spend. But there is one more ingredient I want to talk about. The bottom line is that no government policies will make any difference unless we also hold ourselves more accountable as parents. Because government, no matter how wise or efficient, cannot turn off the TV or put away the video games. Teachers, no matter how dedicated or effective, cannot make sure your children leave for school on time and do their homework when they get back at night. These are things only a parent can do. These are things that our parents must do.
I say this not only as a father, but as a son. When I was a child, living in Indonesia with my mother, she didn’t have the money to send me where all the American kids went to school so she supplemented my schooling with lessons from a correspondence course. I can still picture her, waking me up at 4:30 in the morning five days a week to go over some lessons before I left for school. And whenever I’d complain or find some excuse for getting more sleep, she’d patiently repeat her most powerful defense - "This is no picnic for me either, buster." And it is because she did this day after day, week after week, and because of all the other opportunities and breaks I had along the way, that I can stand here today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want every child in this country to have the same chance that my mother gave me, that my teachers gave me, that my college professors gave me, that America gave me.
I want children like Yvonne Bojorquez to have that chance. Yvonne is a student at Village Academy High School in California. Village Academy is a 21st century school, where cutting edge technologies are used in the classroom, where college prep and career training are offered to all who seek it, and where the motto is - "respect, responsibility, and results." A couple of months ago, Yvonne and her class made a video talking about the impact that our struggling economy was having on their lives. Some of them spoke about their parents being laid off, or their homes facing foreclosure, or their inability to focus on school with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t home. When it was her turn to speak, Yvonne said:
"We’ve all been affected by this economic crisis. [We] are all college bound students…We’re all businessmen, and doctors and lawyers and all this great stuff. And we have all this potential," she said, "but the way things are going,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fulfill it]."
It was heartbreaking that a girl so full of promise was so full of worry that she and her class titled their video, "Is anybody listening?" And so, today, there’s something I want to say to Yvonne and her class at Village Academy. I am listening. We are listening. America is listening. And we are not going to rest until your parents can keep their jobs, your families can keep their homes, and you can focus on what you should be focusing on - your own education. Until you can become the businessmen, doctors, and lawyers of tomorrow, until you can reach out and grasp your dreams for the future.
For in the end, your dream is a dream shared by all Americans. It is the founding promise of our nation. That we can make of our lives what we will;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for all people; and that here in America, our best days lie ahead. And I truly believe that if I do my part and you, the American people, do yours - then we will emerge from this crisis a stronger nation and pass the dream of our founding on to posterity, ever safer than befor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
"Our children spend over a month less in school than children in South Korea. That is no way to prepare them for a 21st century economy. That is why I’m calling for us not only to expand effective after-school programs, but to rethink the school day to incorporate more time - whether during the summer or through expanded-day programs for children who need it. I know longer school days and school years are not wildly popular ideas. Not in my family, and probably not in yours. But the challenges of a new century demand more time in the classroom. If they can do that in South Korea, we can do it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아이들이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가 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떤 그림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경제위기를 핑계로 교육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각자도생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규모의 공교육 부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오바마가 말하고 경계하는 '한국'이란 나라는 그의 머릿 속에만 있는 나라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