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 중심지라는 소르본 대학 건물群. 이젠 소르본대학이 아니라 파리 제3, 제4대학이라 불리는 것들이 이곳에
있다지만, 마치 두터운 성벽처럼 온통 외부인을 막아선 문들 뿐이다. 목이 말라 1.6유로짜리 맥주 캔 하나 사들고는
홀짝대면서 이리저리 빈틈을 찾다가 결국 청소부 아저씨들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일하는 곳을 찾아냈다.
마치 학생인양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더니 어라, 대략 통한다 싶다. 그렇지만 안마당에 들어서서 잠시 발걸음이
헤매는 걸 눈치챈 아저씨가 불러내길래 잠입 실패. 조용히 내부만 한번 둘러보고 싶었을 뿐인데, 방학 중에는
외부인에 닫혀 있댄다.

그다지 팡테옹의 커다란 돔이나 쭉쭉 뻗은 대리석 기둥이 위압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곳 역시 파리의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높고 유명한 곳이랜다.

그가 묻혀 있는 납골당이 바로 이 곳이다. 팡테옹, 고대 로마의 만신전을 의미한다는 이 이름에 걸맞게도
이 곳은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들이 안치되어 있는 거대한 납골당인 거다.

한면에는 마치 성당의 제단이나 모스크에서 메카의 방향을 나타낸 제단과도 같이 움푹 들어간 둥그런 공간에
누군가의 대리석 조상이 숱한 군상들에 떠받들려 있기도 했다. 천장의 돔에서 쏟아져내리는 태양광, 그리고
천장 주변에 그려진 황금빛 벽화들은 왠지 성당과 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한국의 위인들을 안치한다고 하면, 대체 누가 '입소'할 수 있을까. 여전히 뜨끈뜨끈한 현대사의 해석과 평가 문제도
문제려니와, 어떤 분위기의 납골당이어야 할지도 시비거리일 거다. 최근 들어 고조되고 있는 종교간의 갈등도
고려컨대, 그 납골당은 연꽃, 십자가, 만자, 혹은 '마늘과 쑥' 등등 온갖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들이 몽창 소거된
두터운 콘크리트 벙커같은 이미지여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치명적으로 휑뎅그레할 '공실률'도 문제일 게다.

반복 상영되고 있었고, 저 금빛 진자는 계속해서 무언가 궤적을 종횡으로 그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푸코의 진자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난 그저 그 실험이 진행되는 장면을 지키고 선 듯한 저 이집트틱한 고양이상이 반가웠을 뿐.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터키에 갔을 때 거대한 기독교도들의 지하묘지를 봤었는데 거의 유사한 분위기다. 그러한
지하묘소를 카타콤(Catacombs)라 한다던가. 프랑스의 혁명가 마라, 철학자 볼테르, 루소 등 70여명의 학자, 군인,
정치가 등이 묻혀 있고, 아직 250여명은 더 묻힐 공간이 있다고 한다. 훗, 왠지 이곳도 공실률이 꽤나 높군.
꼭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용해야 할까, 사실 뭔가 경건한 분위기여야 했겠지만 그다지 난. 솔직히
좀 기괴하고 집요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프랑스를 위해 사후의 평안마저 갈취당했다면
심한 표현일까.

있다는 거대한 돔이 세워져있다는 곳. 애초 파리의 온갖 전망대 중에서 에펠탑, 개선문, 그리고 팡테옹의 전망이
개중 훌륭하다고 들었던지라 얼른 돔 탐사조에 합류했다.

접근해서 바라본 돔은 한눈에 담기 버거울 정도로 거대했다. 살짝살짝 이가 어긋나 보이는 돔의 기둥들이 다소간의
긴장감을 선사하기도 했지만, 이미 옥상에서 바라본 전망만으로도 이렇게나 멋져서 돔까지 얼른 올라가고 싶었다.



팡테옹의 담당자는 자신의 엉덩이에 코를 묻을 만큼 바싹 뒤를 쫓는 내게 쉼없이 파리의 풍경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했다.

몰랐는데, 이 정도 높이면 에펠탑 2층전망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저 멀리 야트막한 구릉이 아마
몽마르뜨 언덕이 맞나..잘 모르겠지만 만약 맞다면 그 위에 섰을 사크레 쾨르 성당의 하얀 빛까지는 안 보인다.

시선 끝으로 하나씩 쓰다듬듯 따르는 것도 재미난 일이다.

고풍스럽고 장식적으로 보이는 지붕들인지도 모른다. 저 지붕들 자체야 몇백년이나 헤아릴 수 있겠냐만은, 저런
과거의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실생활과 함께 한다는 건 구호로만 요란한 600년짜리 도시네 어쩌네보다
훨씬 강력하게 '오랜 역사'를 증거하는 것 같다.

프림커피 같기도 하고, 세련된 빛깔로 녹이 슨 황동제 장식품같기도 하고.

폭도 넓고 길었다. 에펠탑이나 개선문 위의 전망대와는 달리 강건한 느낌의 기둥 사이로 내다보이는 파리의
전망이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못들은 척 미적거리다가 맨 마지막으로 내려왔다. 등 뒤에서 잠기는 만만찮은 두께의
철문, 그렇게 팡테옹 돔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러고 보면 좀 찝찝한 감이 남았다. 거대한 납골당에 안치된 프랑스의 위인들을 밟고 서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굽어본 셈이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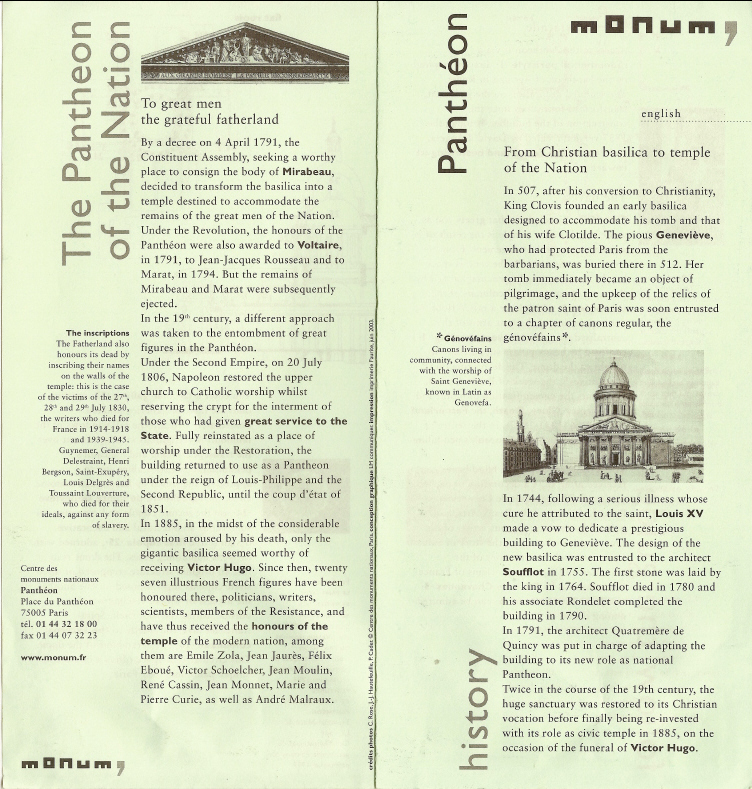
실증한 실험이라고 한다. 글쎄. 이과 쪽 학문에 약한 나로선 당췌 들어도 모르겠다.
'[여행] 짧고 강렬한 기억 > Paris, France-2008'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리여행] 루브르 박물관 10시간 산책기 1/3. (2) | 2009.04.04 |
|---|---|
| [파리여행] 카트도 아닌 것이 바구니도 아닌 것. 이건 뭥미. (0) | 2009.03.09 |
| [파리여행] 빛과 바람, 시간에 희롱당하는 수련..오랑주리 미술관. (4) | 2009.03.06 |
| [파리여행] 방돔광장 가는 길 (4) | 2008.11.06 |
| [파리여행] 노랑빛이 풀어져 내린 흑백사진속의 파리. (2) | 2008.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