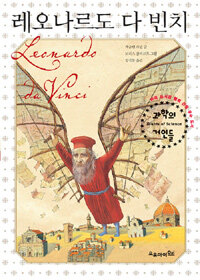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되 겹치지 않고, 어느 한구석 서로에게 타협할 여지는 없다. 미쳤다고 서로를
가리키는 손가락 사이에 타협은 없다. (사실은 영화는 뚜렷이 어느 한쪽에 기운 '진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그 '진실'이 양측에 갖는 효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싶은 거다.)
누군가에게 '미쳤다'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그의 논리적인 항변은 광인의 두서없는 헛소리로, 저항은 폭력성으로,
그의 생존의지는 방어기제의 발현으로,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품고 있는 내밀한 트라우마는 광증이 시작된
'딱 들어맞는' 계기로 이해된다.
미치지 않은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기란 그래서 참 쉬운 일이다. 우리와 당신이 밟고 있는 지반 자체가
다르다, 당신은 당신만의 안개낀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뿐이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 그건 맹렬한
폭풍우의 으르렁거림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우왁스런 윽박지름, 무시무시한 경멸, 싸잡아 내리누르는 일관한 무시까지. 그건 종종 멀쩡한 사람도
미치게 만들 거다. 정신병은 '발병'이 아니라 '발견'되는 거라 어떤 사람이건 그 차가운 이론틀과 개념어로 짜인
거미줄에 걸려 비비적거리고야 말 테니 말이다. 막말로, 히키코모리 법정스님와 김수환 추기경은 두분 다 성격
이상에 변태성욕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대체 욕정을 어떻게 해소한 거지? 변태 아냐?"
결국 숫자 싸움이다. 자신이 받아들이는 지금의 세계가 미친 환상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그 세계내에 포섭되어
자신과 같은 환상을 보는 사람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누구 하나 자신이 지금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만지는 세계가 진짜임을, '레알'임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무리지어 '권위'를 보증할 밖에. 그렇게, 우악스럽게
다수결로 정하는 수 밖에 없단 건 흡사 문명 간의 충돌, 세계관의 충돌을 연상케 한다. 타협할 여지가 없이 각자
꽉 채워져 완결된 이야기로 굳어있으니, 부딪혀 힘센 놈만 살아남고 약한 놈은 부서져 버리는 거다.
여럿의 손가락질에 순순히 자신의 세계를 '배신'하고 미쳤음을 인정했던 그는, 끝내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
나섰다. 그 안에서는 자신이 착한 영웅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자신이 미쳤다며 손가락질하던 세계로 끌려나와
또라이 악한으로 죽긴 싫었으니까, 그는 번번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정합성있는 현실감을 제공하는 '미친 세계'가 '진짜 세계'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에겐 그것이
유효한 진실, 하나뿐인 세상 그 자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계에 그어진 '정상성'과 '비정상성'은 그토록 우악스러운 다수결 논리에 따른 '카드로 만든
집'인지 모른다. 누군가의 트라우마는, 모두의 머릿속과 심장속에 새겨진 트라우마는, 그래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균열짓고 또 동시에 이어주는 저주이자 축복같은 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른
세계를 보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몇명 죽어나가고 인식되기 전까지는 주위에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뿐일지도.
p.s. 요새 영화들에서 느껴지는 점 하나, 배우의 내적 세계와 환상을 뚜렷한 비쥬얼로 표현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는 거 같다. 이전에는 저토록 생생하게 드러내고 보여주기보다 배우의 연기나 독백..? 여하간 좀 다른
방식으로 아리송하게 보여줬던 거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
'[리뷰] 여행과 여행사이 >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주] 여복(女福)과 여난(女亂) 사이. (2) | 2010.04.11 |
|---|---|
| [체인질링] 천안함의 비극, 체인질링의 비극. (2) | 2010.04.03 |
| [더문] ctrl+c & ctrl+v의 인간이란 뭘까. (6) | 2010.03.30 |
| [리뷰] 날 환장시키는 김기덕, 시간. (2) | 2010.03.28 |
| [리뷰] 봄날은 간다. (4) | 2010.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