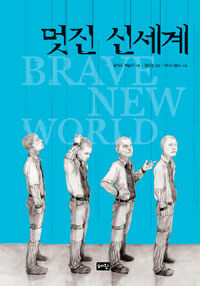|
흔히들 말하듯 유토피아의 반대가 디스토피아, 그런 간단한 말로 축약될 때 뭉개지는 것들이 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이지가 확장되면서 예견하는 밝고 풍요한 미래, 그 자신만만한 예측과 전망이
유토피아의 밑그림이 되는 거야 당연하다지만 실은 그대로 디스토피아의 깔개가 되기도 하는 거다.
"삶의 요소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생활의 학문이라는 수단에 의해서뿐이다...
진정 혁명적인 혁명은 외적인 세계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육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영혼이라는 것과 불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핀과 코카인을 복용했습니다."
"감정은 욕망과 그 욕망의 달성 사이에 있는 시간 속에 숨어있다."
이런 얕지 않은 성찰과 반성을 기반으로, 인간의 물질적/정서적 필요를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충족시키고
부정적인 감정과 불편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건 사실 대부분의 근대화 프로젝트가 공유하는 야심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과 기술, 사회제도까지 송두리째 기울여지는.
"정말로 능률적인 전체주의 국가라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정치적 우두머리인 간부들과 그들 아래의 많은 관리층이
노예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할 필요가 없는 노예를 통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헉슬리가 묘사한 건 그런 야심을 거대한 뿌리로 삼은 커다란 나무가 키워낸 어느 굵은 가지의 한 극한이다.
사회적 역할과 운명이 결정된 인공 수정과 공동 양육, 자유로운 성생활, 더이상의 철학과 상상이 용인되지 않는
'완전한' 사회제도, 정교한 톱니바퀴와 같이 인간이 결핍을 느끼기도 전에 제공되는 물질들, 그리고 신경안정제까지.
아니, 그 '멋진 신세계'에서 완벽하게 충족되는 건 '인간' 일반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빠진 개구리와 같이 인간은 특정 사회제도와 분위기에 함몰된 채 휩쓸려가기
쉽다는 함의도 포함한다. 미래상을 늘어놓기만 하던 소설이 생명력을 얻는 건 버려졌던 땅의 '야만인'이 나타나면서부터다.
그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라 여기는 것들 하나하나에 당혹감을 느끼고, 어느 순간 굉장한 거부감을
토해내게 된다. 그는 셰익스피어 문학에 표현된 '옛 시대' 인간들의 정서와 상식에 기대어, 어느 극단적인 정점에 올라선 채
더이상 과거와 같은 인간이 살 수 없게 된 세계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추한 얼굴을 갖고 있는지 보는 눈을 가진 자다.
결국 그는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어 조롱받고 희화화되다가, 끝내 자살하고 만다. 그 '눈'을 감아버린 셈이다.
그의 죽음이란 현재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거나 역사발전의 이상향 같은 게 끝내 도달하게 될 미래가 얼마나
황량하고 비인간적일지에 대한 감각을 극적으로 폭발시키는 장면이 아닐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끝내 못버텨낼 그런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
어쩌면 그 '원시인'은 단지 일종의 '타임-슬립'으로 인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건 아닐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면,
그는 그 '멋진 신세계'에 적응이 실패한 것뿐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원시의 자연에 살다가 문득 발견된 사람의 아이들이
사회 적응에 실패해서 자살하거나 다시 자연으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지 않은 것처럼, 그도 자신이 준거로 삼은 시대-
그것도 고작 세익스피어의 책 속에 그려진 시대-로 '퇴행'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보다 중요한 건, 책에 그려진 그 '멋진 신세계'의 모습이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비극적이고 비인간적인지 하는 문제다.
"문제의식은 옳았다, 그러나 해결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따위의 어정쩡한 봉합 말고, 인간의 생래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체적,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려는 그 가상한 문제의식과 상황판단을 공유했을 때 어떤 다른 그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원시인과 함께 했던 둘셋의 지식인들이 가진 먹물 고유의 불만은 그렇다치고, 책의 마지막장까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들에서 더욱 가슴 서늘하게 느끼게 되는 부분은 사실 소설 외부에 있다. 사실 지금 도래한
매순간이 외부에서 온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디스토피아일지도 모른다. 상식과 비상식이 어지러이 경합하는 와중에
무엇인가는 쉼없이 탈각되고 생성된다. 일일이 감응할 수 없는 보통사람에게는, 대체로 행복한 시대다. 소설 속 그들처럼.
우리는 어떤 비인간과 어떤 황량한 풍경을 껴안고 살고 있는 것일까. 알량한 행복감에 젖은 채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리뷰] 여행과 여행사이 > 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30크로스', 손쉬운 세대론을 거부하는 세대론 이야기. (0) | 2013.03.07 |
|---|---|
| 이 시대에 문학읽기는 왜 중요한가, 도정일 평론가의 강연. (0) | 2012.12.01 |
|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아니라 성찰에 대해 말하는 책. (0) | 2012.06.10 |
| '백년동안의 고독', 사랑에 빠진 당신에게 묻는다. (0) | 2012.05.13 |
| 맹신자들, 새삼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책은 의심하라. (1) | 2012.03.08 |